서울의 공기는 주말에도 얼어있었습니다. 세찬 바람 없이도 몸 깊숙이 스며 드는 차가운 기운은, 그래도 그런데로 좋았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광화문의 소규모 시위가 통행로를 막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에는 살짝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추운 날 나와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떠들썩한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추위와 얼마간을 다툰 후에 도착한 시네큐브는 다행히 조용했습니다.
<한국 개봉 포스터 from DAUM>
영화 <러빙빈센트>는 더도 덜도 아닌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삶이 아닌 그의 죽음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풀어낸 솜씨는 신선했고, 생전의 고흐의 화풍을 재현한 실제 화가들의 유화들은 유려했습니다.
추리의 형식을 담은 스토리 전개는 호불호가 갈릴것 같은데,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미스터리 추리물 형태를 선택하여 상업적인 흥행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은 투자를 받아야 영화를 찍을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대신에 폴란드 출신의 도로타 코비엘라 (Dorota Koblela) 감독과 휴 웰치맨 (Hugh Welchman) 감독은, 추리의 내면에 고흐에 대한 주변인들의 다양한 평가를 담아두고, 그 다양한 평가가 결국은 모두 고흐 그 자체이며 관객이 고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주요한 도구가 되도록 설정해두는 식으로 현명하게 이야기를 풀어 갑니다. 그의 죽음을 추적하던 아르망의 심경 변화나 고흐의 삶의 단편만을 바라봤을 주변인들의 다양한 증언을 통해 고흐 그 자체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일환으로 107명의 화가들이 62,450점의 유화를 그려 고흐의 화풍이 영화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1초 12프레임으로 뚝뚝 끊기는 듯한 애니메이션 화면은 마치 순탄하지 않았던 고흐의 일생을 대변하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이런 영화의 스타일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일구어내었던 고흐라면 자신의 스타일을 복제한 유화로 가득한 애니메이션에 감사는 하겠으나 감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107명의 화가들에게 '고흐 풍의 화풍'이라는 범위만 제시해주고, 화가들 각각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영화에 담았다면 어땠을까요? 107명의 아티스트가 영화에 참여했으나, 영화 어디에도 107명의 개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러닝타임 동안 고흐에는 취할 수 있었으나, 유화의 획일화된 스타일에서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의구심을 진하게 만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영화가 로토스코프 (Rotoscope : 사진이나 영화로 미리 찍어 이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화해 가는 작화법이나 그 장치) 기법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배우가 있고, 그 배우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배우의 움직임과 연기를 화면에 담아 단지 그 화면을 화가들이 그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와 노력은 인정하지만 '10년간 107명의 아티스트들이 62,450점을 그렸다'라는 셀링포인트 외에 예술적 포인트는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공식 포스터 from IMDB>
클린트 먼셀 (Clint Mansell)은 좋은 음악들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화면들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시선은 빈센트의 죽음을 추적하는 아르망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었으나, 영화의 음악은 고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주변인들의 감정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오랜 경력의 작곡가의 필모그래피는 독립영화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중간 쯤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파이 <Pi, 1988>'에서는 음악과 함께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둠 <Doom, 2005>' 등의 영화에서는 게임에서 나올법한 거친 느낌의 음악들을 내놓았으며, 전지현이 주연으로 나왔던 '블러드 <Blood: The Last Vampire, 2009>'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의 데뷔작으로 볼 수 있는 영화 '레퀴엠 <Requiem For A Dream, 2000>'에서의 그의 음악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블랙스완 <Black Swan, 2010>'에서 한번 최고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레퀴엠'의 음악은 Kronos Quartet과 공동작인 작곡들이 많은 반면, '블랙스완'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느낌을 그대로 녹여낸 음악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식과 오케스트레이션 음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작곡가가 발레와 같은 클래식적 소재를 만났을 때 그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너무 심오한 주제를 다루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영화 <천년을 흐르는 사랑, the Fountain, 2006>으로 'World Sountrack Awards'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한글 제목은 최악이었습니다. 존재와 본질을 다룬 영화 주제를 전혀 담지 못했고, '사랑'을 기대하고 갔던 관객들은 혹평할 수 밖에 없었죠.)
이번 '러빙빈센트'에서의 음악은 음악 자체로는 좋았으나, 영화에 잘 녹아들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초반부터 꽤 많은 수의 현악이 들어간 오케스트라의 사용은 '시각적 스타일'이 첫눈에 들어오는 이 영화의 컨셉을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스토리를 통한 이야기와 감정의 전달에 앞서 음악이 너무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인물에 대한 아르망의 인터뷰와 추적이 계속되고 서서히 고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의 윤곽이 잡혀가는 중반 이후부터는 몰입을 잘 도왔던 음악이라 특히나 초반부의 사용이 많이 아쉽더군요.
좀 더 간결하고 적은 수의 악기로 몰고가거나 아예 음악 사용을 자제했어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흐 풍의 화풍'으로 채워진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95분을 몰입할 수 있었기에 별 3.5개를 주겠습니다. 영화적 기법은 점점 발전하는데 비해, 스토리의 참신함은 줄어들어 1시간 이상을 집중할 수 있는 영화를 만나기 힘든 요즘입니다.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앨범작업기] 착이(with 안병재) - 니가 없는, 밤 (0) | 2020.07.01 |
|---|---|
| [앨범 작업기] 착이,도경 - 나는 너 (0) | 2020.04.26 |
| GoodNotes 용 2020년 달력(PDF)입니다. (14) | 2020.01.01 |
| GoodNotes 용 2019년 달력입니다. (PDF) (4) | 2018.12.30 |
| 이미테이션 게임 <The Imitation Game , 2014> ★★✩ (0) | 2017.10.23 |
| 폭스캐처 <Foxcatcher, 2014> ★★★★ (0) | 2017.10.23 |
| 와일드 <Wild, 2014> ★★★★✩ (0) | 2017.10.23 |
| 소수의견 <Minority Opinion, 2013> ★★★★ (0) | 2017.1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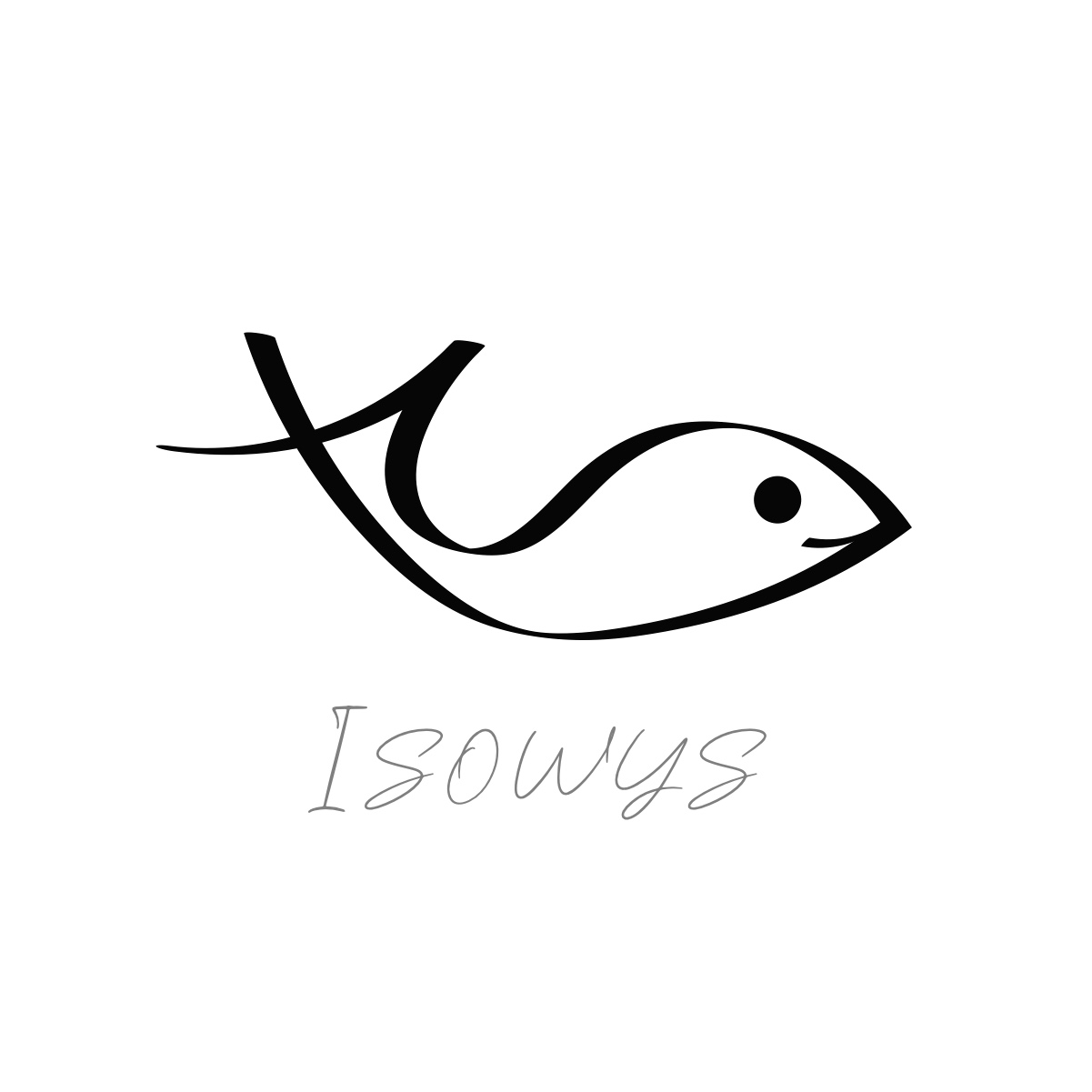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