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보고 싶은 영화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게 있다. 왠지 보고 나면 분명히 괜찮은 영화가 포만감을 느낄게 분명한데도 뭔가가 끌리지 않는. 이번 영화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슬링'이라는 소재가 선뜻 내키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어쨌든, 레슬링이야 그야말로 소재일 뿐이고, 스포츠 영웅의 실화를 다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영화의 전개도 예상가능한 무엇을 내포함에 분명했다. 하지만, <머니볼 (Moneyball, 2011)>을 통해 극적 효과 없이도 단단한 구성과 치밀한 시나리오만으로 폭넓은 호평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베넷 밀러(Bennet Miller) 감독의 연출로 <폭스캐처>의 영화로서의 레벨은 한 두단계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실화를 다루면서도 영화 자체만으로도 그 완성도를 꾀하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감독은 그 양쪽을 적절히 섞어 극적 재미와 현실적 체감율을 높이는 동시에 '레슬링'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그 거침, 땀, 배고픔 등을 영화 전반의 분위기에 녹여내었다.
<미국 개봉 포스터>
<한국 개봉 포스터>
감독의 대단단함도 대단함이지만, 그의 연출을 녹여된 세 배우들의 연기도 신의 경지에 올랐다.
주로 코미디 영화에서의 다소 어설픈 미국남자를 연기하는 데에 익숙해 보이는 존 듀폰 역의 스티브 카렐 (Steve Carell)을 보고 있자면, 왜 이런 경지에 이른 배우를 헐리우드에는 쓸데없는 영화에 소모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가장 복잡한 감정과 느낌을 이 배우는 단 하나의 표정으로 모두 담아낸다. 스티브 카렐을 인식하고 영화를 보고 있더라도 곧 그를 잊고 존 듀폰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에 비해 사실 이렇다할 특징이 없는 배역을 맡은 데이브 슐츠 역의 마크 러팔로 (Mark Ruffalo)는 그 특유의 몸짓과 연기가 원래 레슬링의 무엇에 있었던 듯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 극의 중심을 잡는다. 사실 그의 마스크는 혼자서 튀기 보다는 극의 뒤에서 다른 배역을 뒷받침하는데에 알맞으며, 주연을 맡아도 조연 같고, 조연을 맡아도 주연 같은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는 하는데, 이번 <폭스캐처>에서의 마크 러팔로는 그 동안의 연기 내공을 모두 폭발시키는 듯한 느낌이었다. 레슬링 동작 외에는 아무런 거친 동작도 격렬한 감정이 오고가는 장면 없이도, 그를 중심으로 공기는 거침없이 휘몰아쳤고, 그 중심은 평안한 느낌을 받았다.
채닝 테이텀 (Channing Tatum)도 칭찬해야 겠다. 두 연기 선배 스티브 카렐과 마크 러팔로의 혼연을 쏟아보는 연기 덕분인지, 채닝 테이텀은 그가 맡은 역 마크 슐츠 역에 완벽하게 녹아들었고, 두 베테랑 배우의 내공에 전혀 밀리지 않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무식하고 단순한 캐릭터를 좀 더 섬세하게 녹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살짝 있었으나, 나름 <LA컨피덴셜 (L.A. Confidential, 1997)>의 버드 역을 맡았던 러셀 크로우 (Russel Crowe)가 떠올랐으니, 이 정도면 그의 인생 연기라 할만하다.
실화가 가지는 영화적 재미의 한계는 이 세 명의 배우의 혼신의 연기로 채워지고 남음이 있으므로 8점을 선사하다.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앨범 작업기] 착이,도경 - 나는 너 (0) | 2020.04.26 |
|---|---|
| GoodNotes 용 2020년 달력(PDF)입니다. (14) | 2020.01.01 |
| GoodNotes 용 2019년 달력입니다. (PDF) (4) | 2018.12.30 |
| 러빙 빈센트 <Loving Vencent, 2017> ★★★✩ (0) | 2018.01.27 |
| 이미테이션 게임 <The Imitation Game , 2014> ★★✩ (0) | 2017.10.23 |
| 와일드 <Wild, 2014> ★★★★✩ (0) | 2017.10.23 |
| 소수의견 <Minority Opinion, 2013> ★★★★ (0) | 2017.10.21 |
| 아메리칸 스나이퍼 <American Sniper, 2014> ★★★✩ (0) | 2017.1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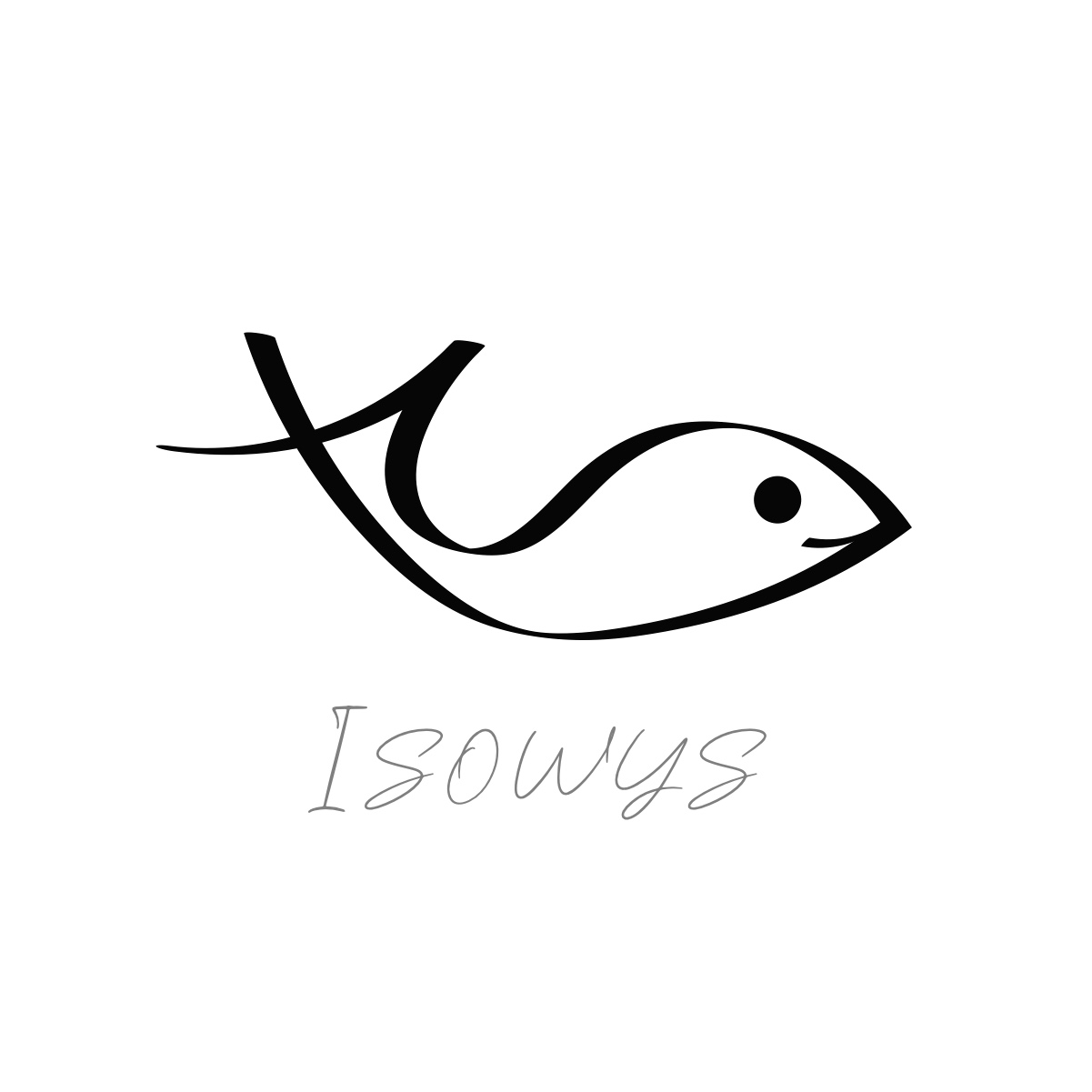 /a>
/a>